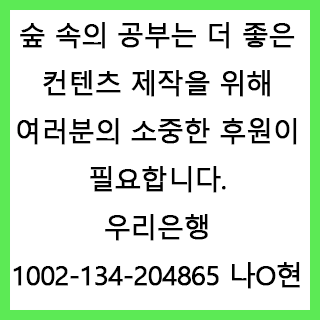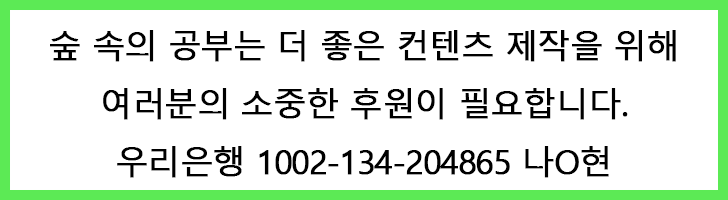천문학
천문학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김석문
김석문은 지전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홍대용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썼으며,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
<의산문답>을 저술하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조선ㆍ중국ㆍ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 지구가 9만 리를 한 바퀴 도는데 그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런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가 겨우 절반이라도 몇 천만, 몇 억 리나 될지 알 수 없다. 하물며 별 밖에 또 별이 있음에랴. 우주 공간에 한계가 없다면, 별이 분포하는 영역에도 한계가 없다. 그 별들이 한 바퀴 돈다고 말한다 해도 그 궤도의 둘레가 얼마나 길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루에 얼마나 빨리 회전할지 상상해본다면, 천둥·번개와 포탄의 속도를 계산하더라도 이보다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의산문답> |
시헌력
역법은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헌력이 도입되었다. 이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종전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 간의 노력 끝에 시헌력을 채용하였다.
| 시헌력(時憲曆)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 |
곤여만국전도
조선 후기에 서양 선교사가 만든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조선 후기 천문학과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천문학과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천문학과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조선 후기
- 한국사 이론 전체
- 조선 후기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