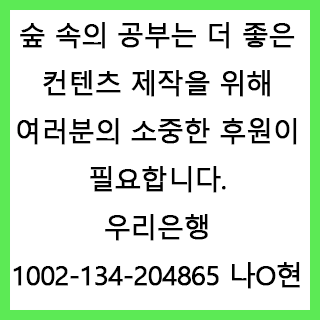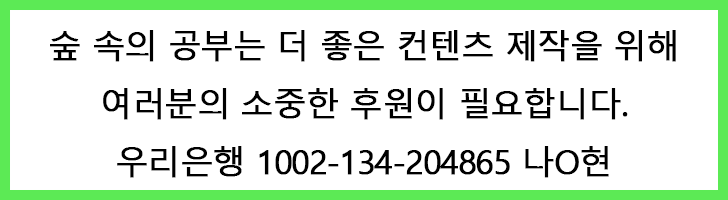붕당 정치의 출현
해당 문서 참조.
정여립 모반 사건
붕당 정치 초기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 서인 | 동인 | |
| 이이, 성혼 | 서경덕, 조식, 이황 | |
| 정여립 모반사건 발생 | ||
| ↙ 분화 ↘ | ||
| 북인(급진파) | 남인(온건파) | |
| 서경덕, 조식 | 이황, 이언적 | |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인조 반정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북인은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다.
또한 북인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취하는 등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이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광해군의 영창 대군 살해와 인목 대비 유폐 등으로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과 북인은 몰락하였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이 산림이란 이름으로 재야에서 그 여론을 주재하였다.
| 산림
시골에 은거해 있던 학덕이 높은 학자 가운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 특별 대우를 받던 사람으로 붕당 정치기의 사상적 지주였다. |
예송
현종 때까지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차 예송
1659년 기해예송.
기년복 1년.
효종의 상을 당하여 자의 대비의 복제가 문제 되었는데, 서인은 1년설을,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하여 1년설이 채택되었다.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차 예송
1674년 갑인예송.
기년복 1년.
효종비의 상을 계기로 또 자의 대비의 복제가 문제 되었는데, 서인은 9개월설을,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하여 1년설이 채택되었다.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중심의 정국이 운영되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사림·사화·붕당 관련 문서
- 훈구와 사림
- 조선 전기의 향약과 서원
- 조선 전기 성리학의 발달(이이, 이황, 주기론, 주리론)
- 사림의 성장과 사화
- 조선 전기 붕당의 출현
-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전개
- 조선 후기 붕당 정치와 탕평론의 대두 (환국)
-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 정치
- 조선 후기 정조의 탕평 정치
- 조선 후기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
- 조선 후기 세도 정치
관련 문서
-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전개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전개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전개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조선 전기
- 한국사 이론 전체
- 조선 전기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