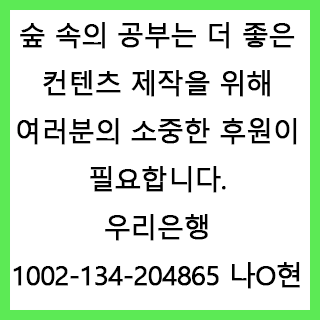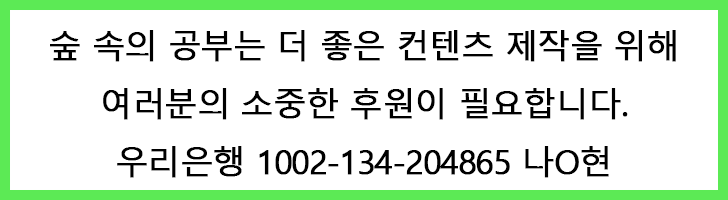조선 중기까지 가족 제도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다만, 성종 때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친영 제도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많아졌다.
제사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재산 상속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양자 입양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족보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다.
혼인 형태
조선 시대의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가 첩을 들일 수 있었다.
첩의 자식인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조선 후기 가족 제도 변화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가족 제도 변화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가족 제도 변화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조선 후기
- 한국사 이론 전체
- 조선 후기 역사 연표